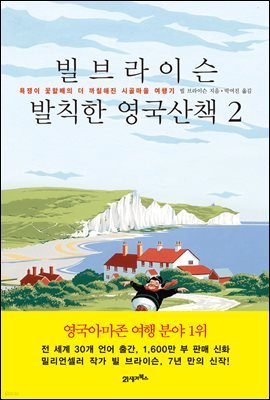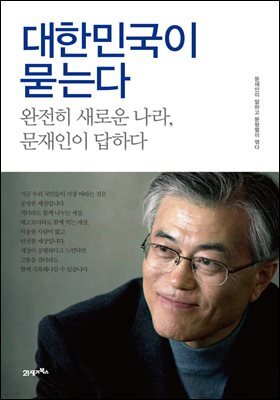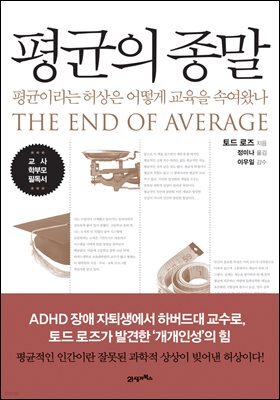다음 생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날게
- 저자
- 선명 저/김소라 그림
- 출판사
- 21세기북스
- 출판일
- 2019-01-29
- 등록일
- 2020-05-0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68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 도서 소개
주지스님이 된 엄마와 스님이 된 딸이 전하는
마음 고요한 산사 일기
엄마와 딸이었던 두 사람이 주지스님과 스님이라는 쉽지 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수행을 이어나가는 잔잔한 일상을 담은 그림 에세이다. 이제는 엄마와 딸이라는 인연이 아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이지만, 둘이 함께 있을 때면 여느 모녀처럼 투닥거리며 절에서의 또 다른 삶을 이어간다. 여기에 저마다의 사연과 개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작은 절에 모여 살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적막하기만 할 것 같은 사찰의 풍경을 활기차게 보여준다. 스님들을 고양이로 캐릭터화하여 그려넣은 따뜻한 일러스트들이 장마다 펼쳐지며 독자들을 잠시 벚꽃 내리는 절 마당의 한가운데로 데려간다.
이 책은 어느 한 스님의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세상 모든 엄마와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쑥스러워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마음속으로 다음 생에는 당신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다짐하는 스님의 이야기는 엄마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전해줄 것이다.
◎ 출판사 서평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늘 미안해하는 사람, 엄마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고, 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마다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 완벽하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엄마’라는 존재가 되면 자식에 대하여 모두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 나의 엄마와 너의 엄마는 분명 다른 사람인데, 우리는 왜 엄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모두 나의 이야기인 듯 격한 공감을 하게 되는 걸까?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걱정하는 사람, 울적한 날이면 귀신같이 내 기분을 알아채는 사람, 나의 사소한 감기가 당신의 오랜 관절염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 한없는 사랑을 주면서도 늘 미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엄마 말고 또 있을까?
어미젖을 찾는 아기 양처럼, 오직 살고자 하는 의지로
엄마와 나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주지스님과 내게는 두 번의 인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날 때 엄마와 딸로 만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출가를 결심하고 절에 들어왔을 때
스님과 스님으로 만난 것이지요.
이 책은 엄마와 딸이었던 두 사람이 주지스님과 스님이라는 쉽지 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수행을 이어나가는 잔잔한 일상을 담고 있다. 스님들의 일상은 특별할 것 같고, 더욱이 스님이 된 딸과 스님이 된 엄마의 이야기는 절절할 것만 같지만, 어쩐지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엄마를 떠올리게 된다.
잔소리를 듣고 말대꾸를 하다 혼이 나고, 사소한 일상의 일들로 때로는 투닥거리며 다투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언제 말다툼을 했냐는 듯 내 밥 걱정을 해주는 사람.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엄마가 있다. 스님에게도, 주지스님에게도 엄마가 있다. 다만 이들에게는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넘어서서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큰 과제가 주어져 있을 뿐.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선명스님이 이야기하는 엄마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작은 절에 모여 살며 빚어내는 70여 편의 아기자기한 에세이
흔히 절 생활이라 하면 비질하는 스님의 모습 뒤로 바람 따라 풍경 소리가 청명하게 울려퍼지는 고요한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선명스님이 그리는 절에서의 모습은 아주 역동적이고 활기차다. 잡초 뽑기가 싫어 꾀를 부리다 결국 혼이 나는 스님, 아이들에게 “우리 강아지” 대신 “헤이, 메뚜기! 헤이, 지렁이!” 하고 부르는 헝가리 스님, 절의 진짜 주인인 고양이 가족 이야기 등 이 책 속에 등장하는 70여 편의 아기자기한 글들을 읽다 보면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깊숙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여기에 스님들을 고양이로 캐릭터화하여 그려넣은 따뜻한 일러스트들이 장마다 펼쳐지며 독자들을 잠시 벚꽃 내리는 절 마당의 한가운데로 데려간다.
세상 모든 엄마와 딸에게 바치는
스님의 마음 편지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의 이름은 엄마와 아들, 혹은 아빠와 딸이라는 이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엄마에게 있어 딸은 자식이면서 동시에 남편보다도 훨씬 더 강한 유대감을 공유하는 인생의 동지다. 살을 떼어주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둔 어머니가 출가를 결심하기까지 어떤 삶을 견뎌냈을지, 또한 그런 자신을 뒤따라 함께 스님이 된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어느 한 스님의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세상 모든 엄마와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쑥스러워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마음속으로 다음 생에는 당신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다짐하는 스님의 이야기는 엄마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전해줄 것이다.
◎ 책 속으로
어릴 적에 엄마가 나를 붙잡고 울던 모습이 이따금씩 떠오릅니다. 아마 이혼 후에 사기를 당하고, 홀로 세상살이를 버티고 버티다 고통이 목까지 차올라 서러움이 터져 나오던 날이었겠지요.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 왜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니…….” 울면서 어린 나를 때리던 엄마. 때린다고 때리는데 너무나 힘이 없어 마치 버들가지가 스치는 것처럼 느껴졌던, 한없이 작았던 엄마……. 엄마는 아침에 눈뜨는 것이 가장 두렵다 했었지요. 어린 오빠와 나를 두고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버티고 살던 그때 엄마의 나이를 생각해보니 지금 내 나이쯤이었습니다.
_ 17-18쪽, 〈산〉 중에서
명절 무렵이면 절에 선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개는 과일, 한과, 차와 같은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속가에 계신 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생선을 보내십니다. 여러 해가 바뀌어도 한결같이 생선을 보내주시기에 한번은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생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알아” 하고 전화를 뚝 끊으십니다. ‘아, 아버지도 알고 계시지…….’ 그래서 보내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스님이기 전에 자식인 것이지요.
_ 28-29쪽, 〈생선〉 중에서
주지스님과 모처럼 단둘이 있을 때는 여느 모녀들처럼 엄청나게 싸우고 부딪칩니다. 특히 장거리를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화가 늘 아름다울 수만은 없습니다. 두세 시간을 아주 격렬하게 티격태격, 내 말이 맞네 틀리네…… 그리 싸우다 보면, 도착하기만 해봐라, 주지스님하고 말 안 해야지, 속 터지게 입 꾹 다물고 있어야지, 하고 수십 번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보면 그 격렬했던 싸움은 어디로 간 것인지……. “배고파요.” “그렇지? 우리 밥부터 먹자.” 주지스님과 나는 또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배가 부르고 나면 마음이 넉넉해져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일상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_ 41-42쪽, 〈밥부터 먹자〉 중에서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늘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혼자, 나는 나 혼자. 그리고 둘이 함께 있을 때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딸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웃었고, 나는 그런 엄마가 행여라도 잘못될까 봐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차라리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더라면 덜 외로웠을 것을.
_ 44쪽, 〈안간힘 쓰지 않아도 괜찮은 여유〉 중에서
우리 절에는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고양이 엄마 아빠가 새끼를 낳았고 아기 고양이들이 자라서 또 새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오기 한참 전부터 고양이 가족들은 이곳에 살고 있었으니 어쩌면 이곳의 진짜 주인은 고양이 가족들일지 모릅니다. 절의 사람들과 절의 고양이들은 그래서 곁눈질로 서로의 동태를 파악하며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풀을 뽑는데 고양이들이 응가를 하던 자리에 풀꽃이 피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노란 꽃, 보라 꽃... 색깔도 모양도 가지가지의 꽃들이 피었습니다. 무얼 먹은 걸까요, 고양이들은.
_ 54-55쪽, 〈고양이 가족〉 중에서
주지스님은 모든 것이 반듯해야 합니다. 옷을 위아래 깔끔하게 맞춰 입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밥상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반듯하게 놓여야 하고, 반찬을 놓을 때도 식재료의 색깔을 고려해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보기 좋게 놓아야 합니다. 절 마당에 있는 작은 바위들이 멋대로 놓인 것이 못마땅해서 돌 머리를 낑낑거리며 끌어다 반듯하게 놓은 적도 있습니다. 봄에 농사를 지을 때도 모종들이 줄이 삐뚤게 심겨 있으면 다시 다 뽑아서 줄을 맞춰 반듯하게 심어야 합니다. 하루는 밭에 들어가 마치 거실 바닥 청소하듯 밭고랑 사이를 빗자루로 유유히 쓸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_ 78-79쪽, 〈잔소리〉 중에서
그렇게 흙을 만지고 있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왠지 모를 위안까지 느껴집니다. 흙이 나보다 훨씬 더 너그럽기 때문이겠지요. 크기도 나보다 크고, 지닌 성질도 나보다 선하고, 생명을 키워내는 힘도 나보다 어머어마하게 강하니 흙에게 위로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건 조용하고 너그럽고 거대한 기운,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기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_ 90쪽, 〈잡초 뽑기〉 중에서
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인연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수없이 참고 견디는 일을 반복하는 분께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만 참으세요.” 쥐고 있는 이에게는 놓는 것이 수행이고, 놓기만 하는 이에게는 쥐어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이에게는 견디는 것이 수행이고, 참는 것이 익숙한 이에게는 그만 멈추는 것 또한 수행입니다.
_ 137쪽, 〈수행〉 중에서
주변이 온통 바위로만 이루어진 곳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생각해보세요. 꽃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이 참 외로울 겁니다. 거칠고 어둡고 메마른 곳에 홀로 꽃을 피웠으니 참 서글프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꽃은 도대체 얼마나 귀하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기에 그리 척박한 곳에서 홀로 꽃으로 피어난 것일까요. 자신이 아팠다고,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두렵고 서럽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강하기에 그런 모진 아픔을 이겨내고도 이리 살아 있는가.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_ 138-139쪽, 〈바위산의 꽃 한 송이〉 중에서